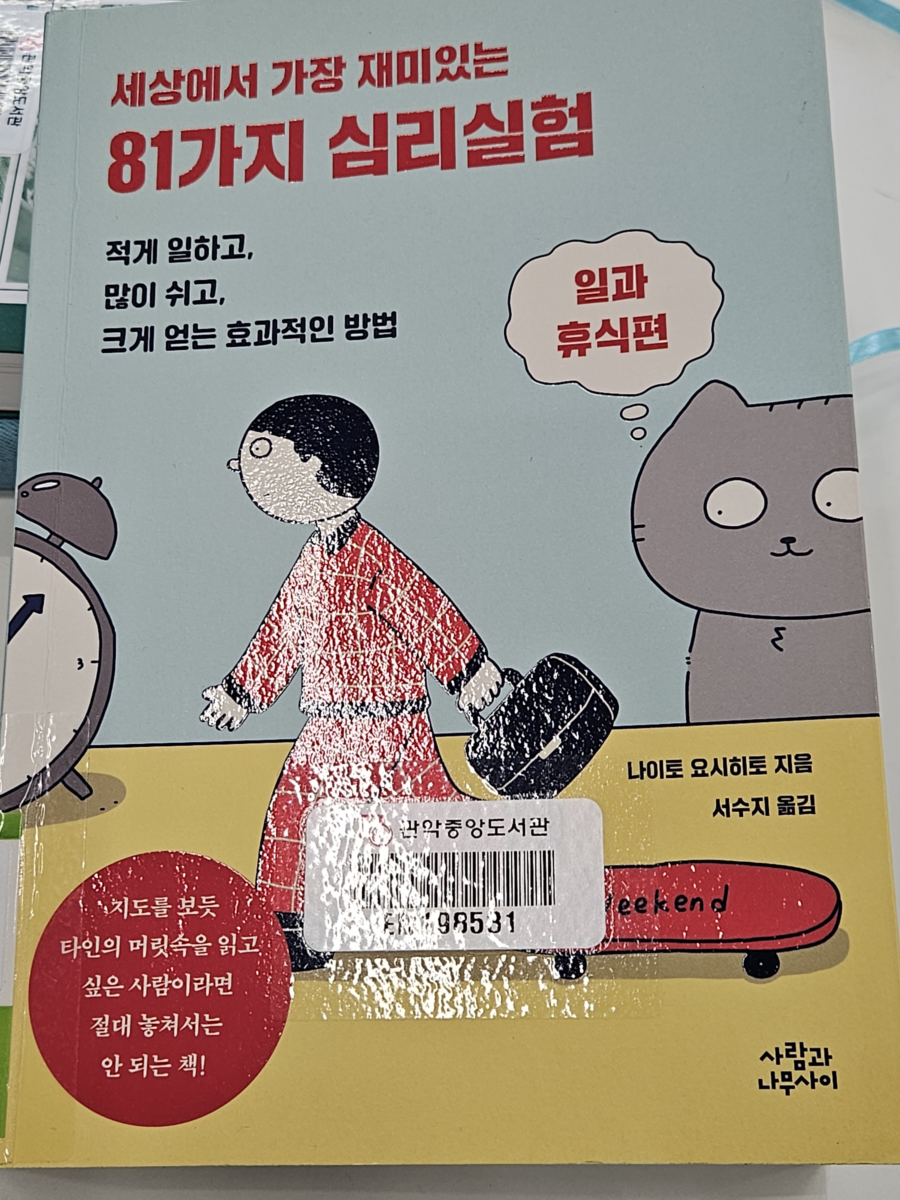이것도 숏폼 트렌드에 맞춘 편집인가. 한 이슈당 두 세쪽 분량으로 짤막하게 정리하는것까진 좋은데. 관련 실험이나 논문을 딱 하나만 소개해서. 메타분석이나 심리학계의 중론은 알 수가 없다.
자연과학계도 서로 대립하는 결과의 논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텐데. 하물며 사회과학에 속하는 심리학계의 논문을 달랑 하나씩 소개하며 한 꼭지를 정리하니. 호기심 천국 그 이상 그 이하의 공신력도 아님.
게다가 밥 먹으면 배 부르다 수준의 상식적인 가설과 검증결과 이슈도 많고. 그냥 재밌게 보자.
★☆☆ 별 한 개
피터스와 스트링의 주장은 술자리가 ‘인맥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그럴듯하게 바꿔 말하면 ‘술자리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애기다.
최근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대개는 사람들과 어울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기 니 하며 술을 마시곤 한다. 요컨대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은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인맥 네트 워크가 확장될 수 있다는 말이며, 인맥이 넓어지면 당연히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연구팀은 술을 즐길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컬어 ‘드링커스 프리미엄(The Drinkers Prernium)’이라고 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10퍼센트의 드링커스 프리미엄이 붙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술을 마시러 자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더해 연 수입이 7퍼센트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어디까지나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술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늘 정해진 술친구와 어 울려 마시는 경우 술은 수입을 늘려 주지 않는다.
술이건 음악이건 다른 그 어떤 취향이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게 핵심이다. 술은 가장 제너럴한 취향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 나가서 만나고 연결되어야 한다. 거기서 기회가 나온다.
협상할 때는 되도록 세세한 금액을 제안하는 게 효과적이다. 끝자리가 딱 떨어지는 금액은 계산하기에 쉽고 편할지라도 자칫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볼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이 어떨까요? vs. 1,065만 원이 어떨까요?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닌, 후자처럼 더 구체적인 금액을 제 안하는 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만만치 않은 협상자’라는 인상을 주어 상대가 함부로 대 하지 못한다. 또 세세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과감한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다.
미국 뉴욕주 컬럼비아대학교의 말리아 메이슨(Malia F. Mason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 협상 실험 참가자 280명 을 모았다. 이들 참가자의 나이는 평균 30.4세였다. 이 실험은 보석을 사들이는 보석상과 보석을 팔러 온 고객이 가격 홍정 을 벌인다는 설정이었다. 실험 참가자는 보석상 역할을 맡아 고객이 가져온 보석을 감정하고 매입해야 했으며, 보석을 팔 러 온 고객은 19달러, 20달러, 21달러의 세 가지 가격을 제안 했다.
이건 꽤 납득이 가는 주장이다. 호가 10억 아파트를 산다고 할 때, 9억 5천에 해주세요보다 9억 4천700에 해주세요. 연봉 1억 주세요라고 하기 보다, 1억 700만원 주세요.
이런식으로 제시하면. 상대는 ‘어? 얘는 뭔가 이유가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인즉슨 나름의 전략과 논리가 있다는 걸로 비춰지는 것.
반대로 그냥 9억에 해주세요. 1억 주세요. 같은 방식은 ‘그냥 내지르는구나’로 보이는 것. 그냥 쉬운 선택을 했네. 별도 전략은 없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소 개된 폭스 박사는 사실 연구팀에서 섭외한 배우 마이클 폭스 (Michael Fox)였다. 물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진지한 강연이니 즉석에서 내용 을 꾸며 낼 수는 없었다. 연구팀은 폭스 박사를 철저하게 훈련 해 60분짜리 가짜 강연을 준비했다. 강연 후에는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기에, 이때 애매하게 돌려 말 하고 엉터리로 지어 낸 단어와 관련 없는 이야기 등으로 스리 슬쩍 빠져나가는 기술을 확실하게 가르쳤다.
횡설수설하는 헛소리가 가득했던 강연에 대해 청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연구팀은 강연이 끝난 후 설문지를 돌려 청 중의 강연 소감을 확인했다. ‘충분히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응답이 90퍼센트,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는 응답도 90퍼센 트가 나왔다. ‘새로운 자극이 되는 내용이었나?’를 묻자 무려 100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하지만, 두서없는 논리에 허무맹랑한 가짜 이론을 늘어놓은 강연이었다. 이해합 수 있을 리 없는데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멋진 강연이었다 라고 감탄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권위 있는 전문가 또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말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동조
생각보다 더 놀라울만큼, 사람들은 기존 권위에 의존한다. 그게 전문직이라 해도 마찬가지. 오히려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기 카르텔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욱 쉽게 믿을 지도. 그게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
결국 개인의 각성보다 구조로 걸러내야 한다.
우리 뇌는 ‘신체적 아픔(상처, 부상 등)’과 ‘심리적 아픔(다른 사람 의 무시 등》을 기본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할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통증을 느끼면 뇌에서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다’와 ‘마음이 아프다’ 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우리 뇌는 이들 간 차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미국 켄터키대학교의 C. 네이선 디월(C. Nathan DeWal)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가설을 떠올렸다.
우리 뇌가 신체적인 아픔과 심리적인 아픔을 같다고 느낀 다면 신체적인 아픔을 줄이기 위한 약을 투여해 심리적 아픔 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연구팀은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진통제 아세트아미 노펜을 준비했다.
언어폭력은 신체폭력과 동일하게 아프다. 아픔의 강도가 아니라 뇌가 아픔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몸 뿐만 아니라 맘을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맘이 아파도 타이레놀 먹으면 된다는 것.
각자 배우자의 취향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젊은 부부의 정답률은 42.2퍼센트였다. 절반 이상이 빗나갔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다.
그렇다면 장년 부부는 어땠을까? 40년 이상을 해로한 부부라면 배우자의 취향 정도는 척척 꿰 고 있으리라 예상되지 않는가? 장년 부부의 정답률은 젊은 부부의 정답률보다 낮은 36.5퍼센트였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취향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연구팀은 배우자의 취향을 추측하라고 하며 ‘확신도’도 함께 조사했다. 자기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장년 부부일수록 자기 예상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거라고 확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아내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다. ‘나는 남편에 대한 것이라면 내 일보다 더 잘 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장년 부부가 있다면 단순한 착각이 라고 알려 주고 싶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왔고 본인들이 행복 하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말이다.
장년 부부의 정답률이 낮은 것도 놀랍지만. 실생활에서 더 큰 문제는 장년 부부의 ‘확신도’다. 내가 상대를 잘 안다는 확신! 생각해 보면 나도 나를 모르고 나의 취향과 선택이 외부 요인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떻게 확신한단 말인가?
확신에서 사달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