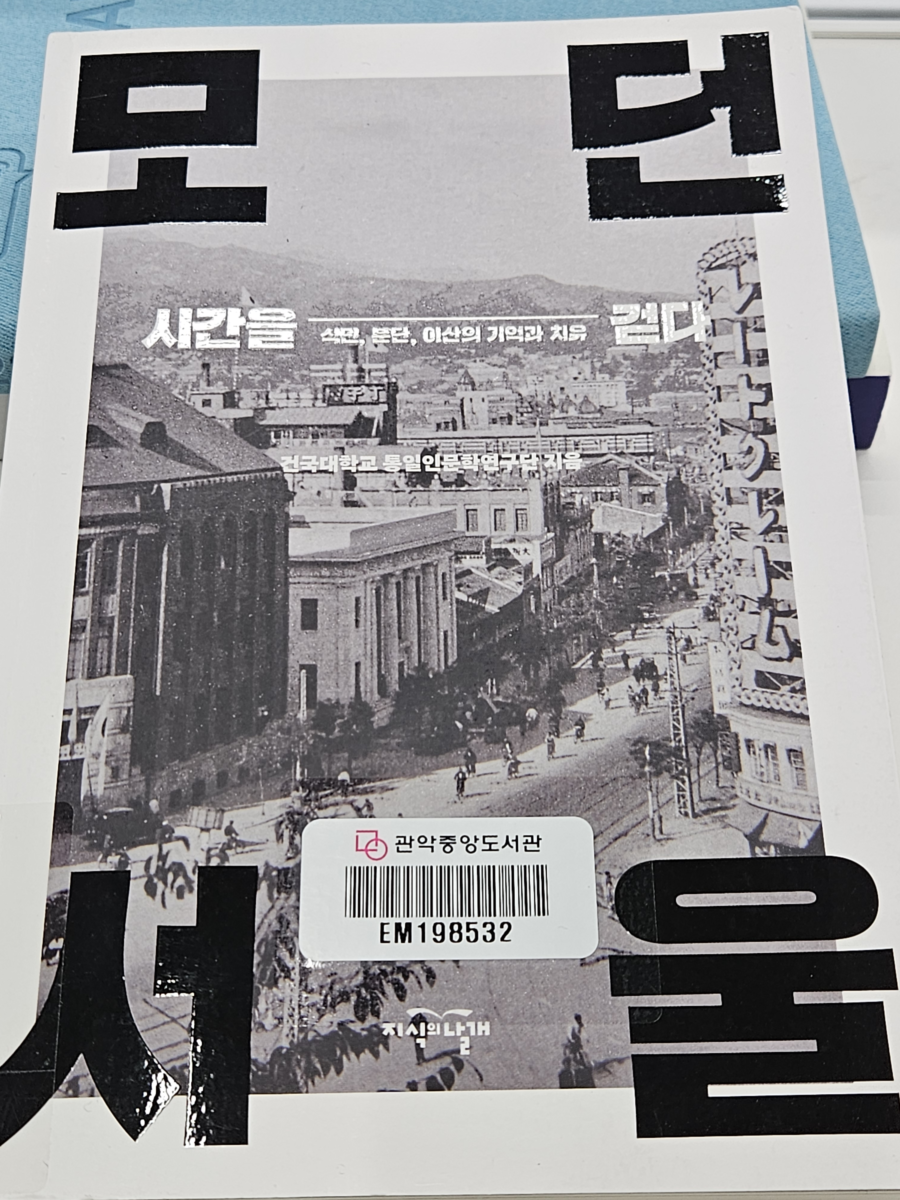그렇다고 국가권력이 완전히 범의 태두리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폭력을 자행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상계임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반정부 인사들을 강제로 체포, 구금했으며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밀란 쿤데라는 『지혜」에서 “권력은 자신의 범죄를 질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처럼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할 때면 어김없이 국가 안보니 공공의 안녕질서를 명목으로 내세워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다.
요컨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국가권력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으면서도 법을 이용하며 국가 본연의 의무인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한다. 그렇기에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모순성은 은폐되기 쉽다.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이 명목상 내세우는 위협의 대상은 북한과 간첩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것은 정의로운 것으로 둔갑하기 일쑤였다. 많은 사람이 5.18 항쟁을 북한과 연계한 폭동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니 간첩이니 하는 것은 대부분 실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상당한 위험에 직면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주목 받길 원하고 극적으로 과장된 감정을 표현하는 히스테리(연극성 성격장애) 환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히스테리 환자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히스테리 환자는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국가권력은 그렇지 않다 국가권력의 불안 제스처는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정치의 절반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모던서울’ 中
2025년 12월 3일 계엄을 논하는 문단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잘 들어맞는다. 서울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도.
대한민국 정치사는 구불구불거리며 끝없이 진보하는것 같다가도. 엉뚱하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크게 역류하기도 한다. 이또한 큰 흐름의 일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