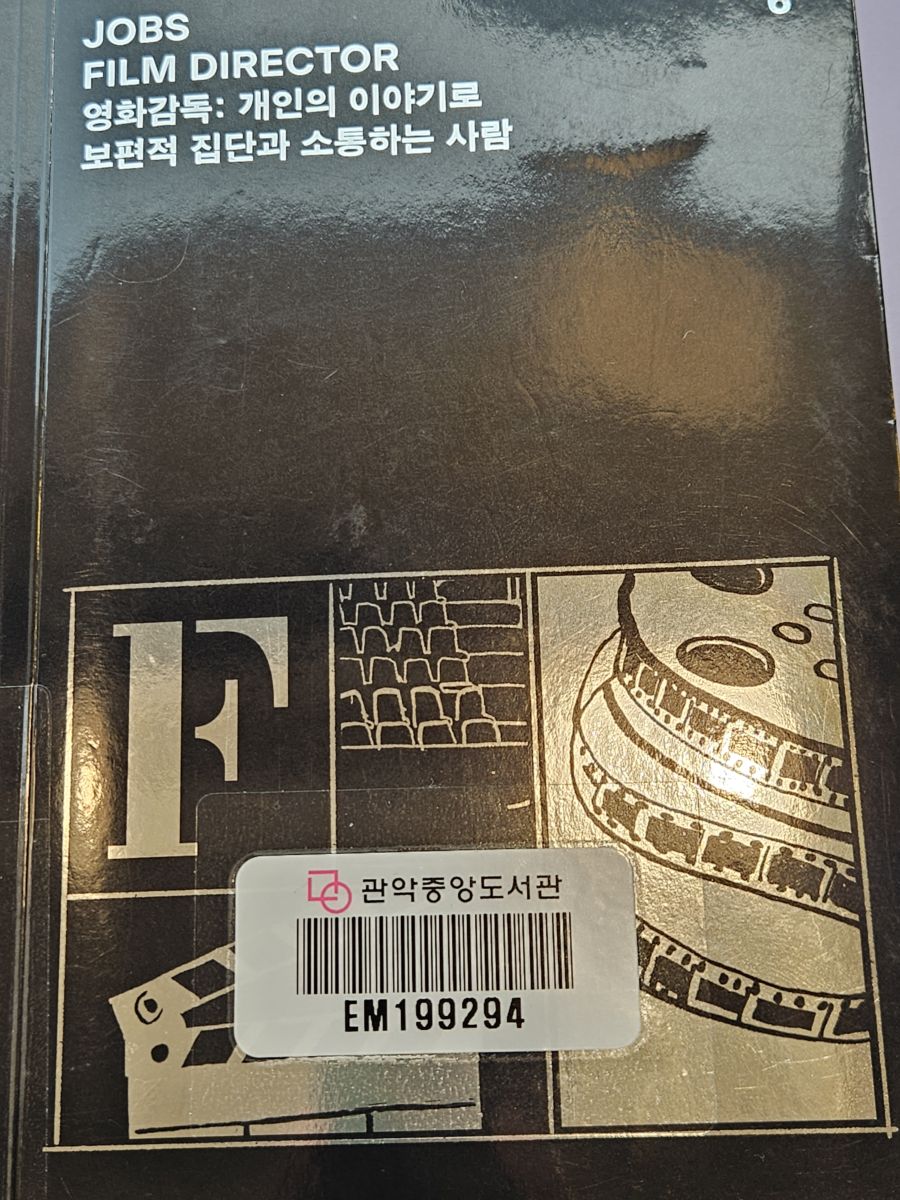가볍게 보기 좋은 정도. 별 둘.
엄밀히 본다면 영화를 디렉팅하는 역할만을 영화감독으로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데뷔 이후의 영화감독은 매 편마다 사업 기획서를 쓰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기획서를 쓰고, 기획 단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내는 거죠.
각본을 포함해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한 구성을 저는 사업 기획서에 빗댈 수 있다고 봐요. 단지 그 기획서가 스토리를 가진다는 게 차별적인 셈이죠. 비상업적 발상으로 시작해 상업적인 상품으로 비전을 다듬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 제작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감독으로 불리게 돼요.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준비생, 지망생일 뿐이고요.
곧 영화감독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은 투자 단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모든 비즈니스는 자본과 감각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곤 했는데, 영화도 이 공식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본이 스폰서가 될 때 비로소 감각이 꽃을 피울 수 있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영화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영화감독으로 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감독은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직업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직업이라고
영화 감독은 예술가인가? 예술가면서 비즈니스 맨이기도 해야한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영화를 만들 수도 없거나, 만들어도 폭망하거나.
그의 데뷔작과 후속작을 모두 극장에서 봤다. 그걸로 끝이라고 확신했다.
두 영화는 영화광 출신이 만든 영화가 갖는 자기 풍자적인 재미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 양반이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경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작들을 줄줄이 내어놓는 명장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만약 어떤 영화평론가 “저는 <달은 해가 꾸는 꿈,을 보고 지금의 박찬욱을 예상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지독한 거짓말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데뷔작을 <공동경비구역 JSA>(2000)’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 을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박찬욱 감독조차 “<공동경비구역 JSA>를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니.
그렇다면 두 편의 엄청난 실패작을 내놓고도 어떻게 박찬욱 감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걸까. 그는 연이은 비평적•홍행적 실패로 도무지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계속 영화를 찍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앞의 설익은 시기에 대실패를 해도 어쨌든 계속했기 때문이다. 무슨 비법을 원하는 사람에겐 난감하거나 화가 날 정도로 뻔한 이야기인데. 대개 진리는 그런 뻔함에 뻔뻔하게 드러나 있다. 다만 후학들이 그거 말고 다른 요행 없나 계속 들출 뿐.